
학령인구 감소, 교육환경 급변
도시지역 학교 불균형도 심각
‘학교의 위기’ 함께 풀어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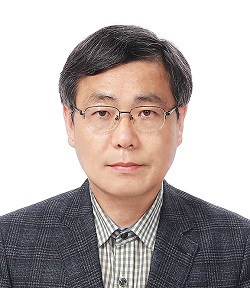
농어촌 작은 학교인 부안 하서초등학교에서는 24일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 부안군 하서면 지역의 3개 학교를 합쳐 새롭게 문을 여는 ‘통합 개교식’이다. 하서면에 있던 기존 하서초와 백련초, 장신초 등 3개 초등학교가 하나로 합쳐 지난달 새 학기를 함께 시작하고, 이날 기념행사를 열게 된 것이다. 이들 3개 학교 통합은 교육청이 아닌 지역주민 주도로 차근차근 추진됐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지난 2011년 하서면 주민들이 교육청에 학교 통합을 요구했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의지를 확인한 교육청에서 행정절차에 나섰다. 그리고 올해 예정대로 통합학교가 문을 열었다. 통합학교 부지는 접근성이 좋은 장신초, 교명은 지역의 정체성 유지 측면에서 하서초로 결정됐다.
남원에서도 학생 수 감소로 존폐 위기에 몰린 농촌 작은 학교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공간적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대상 학교는 대강중, 수지중, 금지중, 송동중으로 학교명과 같은 이름의 4개 면 지역에 딱 하나씩만 있는 중학교들이다. 이 중 수지중학교는 당장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먼저 송동중학교에 통합됐다. 인접한 2개 학교가 통합한 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돼 재통합을 추진해야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권역을 넓혀 ‘거점형 학교’를 조성, 육성하겠다는 게 교육청의 방침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의 위기는 농어촌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도시로의 인구이탈이 계속되는 원도심지역 학교도 처지가 농촌 학교와 별반 다르지 않다. 도심 작은 학교로 전락한 전주 완산초와 곤지중은 지난해 하나로 합쳐 초‧중 통합 운영 학교가 됐다. 전주지역 중학교의 경우 학교 간 불균형도 심각한 문제다. 교육청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선호도가 낮은 학교의 학급 수를 줄이고, 지원자가 많은 선호 학교의 학급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에서 과대‧과밀학교가 속출해 원도심 학교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작은 학교 통폐합 문제는 1980년대 이후 줄곧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다. 학교 통폐합이 지역공동체 붕괴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학교와 상관없이 지방도시는 소멸 위기를 맞았다. 이제 학교를 넘어 지역 소멸을 먼저 걱정해야 할 판이다. 교육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대안도 없이 작은 학교 통폐합을 금기어로 내세운다면 이렇다 할 처방조차 내놓지 못한 채 ‘출구 없는 소멸’로 갈 수도 있다.
인구절벽 시대, ‘학교의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도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폐교를 피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농어촌과 원도심지역의 작은 학교 통폐합에만 집중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지역의 교육여건을 다각도로 검토해 학교 재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 운영 자체가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이 서둘러 통폐합을 추진하기보다는 지역의 모든 학교를 폭넓게, 멀리 보면서 학교 재배치 방안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지역 내 학교 불균형 문제와 지역공동체의 지속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찌감치 예고된 ‘학교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 공론화 절차를 지금 시작해야 한다. 숱한 논란과 날선 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다고 애써 피하거나 배척할 일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소멸 위기를 맞은 지역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다. 이제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학부모‧지역주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학교 재배치와 폐교 활용 방안 등을 차근차근 논의해야 할 때다.
/ 김종표 논설위원
김종표 칼럼
청사진만 넘쳐나는 전북, ‘희망 고문’은 이제 그만 ‘내가 가져왔다’ 국가예산 생색내기, 불편하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지역의 주인은 누구였나 ‘알아야 즐긴다’⋯ 문화의 시대, 문화예술 향유능력 [김종표의 모눈노트] 통합 익산시 30년, 학교에 붙잡힌 ‘이리’ 모교도 몰라볼 판인데⋯, 또 바꾼다고? ‘갈등(葛藤)’의 계절, 대선과 새만금 분쟁 ‘ONLY 전북’ 특성화·차별화가 경쟁력이다 ‘페넬로페의 베짜기’ 새만금, 언제까지⋯ 늘어나는 공립학원, 전북 ‘교육협치’ 갈 길 멀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