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판 송덕비’ 난립⋯ 염치를 내던진 사회
생존 인물 선양사업 우후죽순
지역홍보 목적 지자체가 주도
당사자 ‘겸양의 덕’ 아쉬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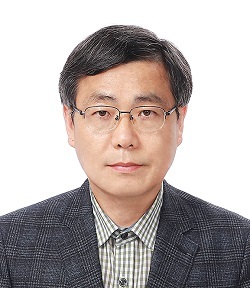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기자들에게 종종 했다고 알려진 말이다. 이 발언은 훗날 그의 생애를 조명한 책의 제목으로 쓰이면서 유행어처럼 세간에 회자됐다. 발언의 취지와 의도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지만, 자신의 공적과 과오에 대한 평가를 당대가 아닌 사후(死後)에 받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후세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평가할까. 40여년이 흐른 지금도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경북 김천시가 일찌감치 그의 이름을 따서 조성해놓은 거리를 놓고도 논란이다.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거액의 세금을 들인 김천시는 철거 여부에 대한 결론을 쉽사리 내지 못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백성을 아끼며 선정을 펼친 관료의 공을 기리기 위해 그가 떠난 후 마을 사람들이 ‘송덕비(頌德碑)’를 세웠다. 지금도 이 송덕비가 다양한 형태로 세워지고 있다. 업적과 공로를 인정받아 곳곳에 기념비를 남긴 인물이 후세에 전혀 다른 방향에서 재평가를 받아 대중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한다. 그런데도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는 이유로 동시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급하게 포장해서 내세우는 생존 인물 선양사업이 곳곳에서 넘쳐난다. 심지어 스스로 송덕비를 세우기도 한다. 선거철이면 낯뜨거운 대필 자서전이나 일대기를 내놓고 출판기념회까지 여는 게 관례가 됐다. 자화자찬이 도를 넘어 읽는 사람이 민망해지는 책도 있다. 과거 선조들이 중시했던 ‘겸양지덕(謙讓之德)’은 찾아볼 수 없다.
지자체까지 나서 예산을 쏟아붓는다. 지역 출신 유명인을 내세워 고장을 홍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의도다.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을 놓고 생가복원 사업을 하고, 동상이나 흉상을 세우고, 거리에 그의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어떤 흉측한 일에 연루될지, 사회적 평가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전북지역 지자체도 예외는 아니다. 군산시는 수년 전 노벨문학상 후보에 올랐던 지역 출신 고은 시인 선양사업을 추진하다 홍역을 치렀다. 시인이 성추행 논란에 휩싸이면서 그의 이름을 딴 각종 문화사업과 생가복원 사업을 중단했고, 이미 건립된 시비 철거 요구에 진땀을 흘려야 했다. 지역의 자랑으로 여겨 애써 발굴하고 포장했던 인물의 흔적이 어느 순간 지워야 할 얼룩이 된 것이다. 논란이 일지는 않았지만 정읍과 김제·임실 등 몇몇 지자체에서도 현재 활동 중인 지역 출신 유명 가수의 노래비와 효열비를 세우고, 시인의 생가를 복원해 지역의 명물로 내세웠다.
지자체가 이 같은 선양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연히 당사자와 먼저 상의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팔을 걷어붙이고 말렸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극구 사양한 사람은 밀려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만 대중에게 부각된 꼴이 됐다. 이런 낯뜨거운 선양사업에 못 이긴 척 편승해 은근히 즐기는 사람도 있다. 자신을 성찰하고 낮추는 겸양의 덕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애초에 기억되고 추앙받을 자격이 없다. 결국은 지자체가 자격도 없는 사람을 지역의 자랑으로 내세우는 일에 혈세를 쓴 것이다.
세상을 호령한 권세가의 무덤에 침을 뱉는 것보다 저잣거리 필부(匹夫)를 상대로 면전에서 험담을 하는 게 더 어렵고 불편한 일이다. 그래서 선인들은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 송덕비를 세우거나 일대기를 펴내는 일을 삼갔다. 혹시 주변 사람들이 말하지 못해 세상이 몰랐던 어두운 면이 사후에 드러나지 않을까 신중하게 살폈던 것이다. 지자체에서 성급하게 세워놓은 ‘현대판 송덕비’의 당사자는 이를 자랑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부끄러워하면서 언행에 더 신중해야 한다. 죽을 때까지.
/ 김종표 논설위원






 홈
홈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