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목대] 창암과 추사 - 조상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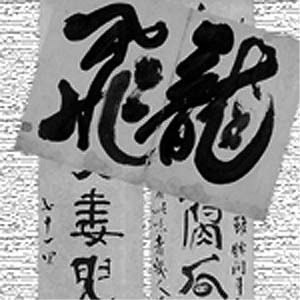
창암(蒼巖) 이삼만은 1840년 9월 제주도 귀양길에 오른 추사(秋史) 김정희와 전주에서 만난다. 당시 창암은 71세의 노인이었고, 추사는 55세였다. 누가 먼저 청했는지 오르나 이 자리에는 당대 명필로 이름을 날리던 추사를 보기 위해 여러 사람이 몰렸다.
창암이 쓴 글씨를 본 추사는 그 자리에서 주저없이 내뱉는다. "노인장께선 지방에서 글씨로 밥은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렸다. 지방에서 글씨로 밥은 먹겠다? 이 말 속에는 "지방에서 행세깨나 하는 것 같으나 촌티를 벗지 못했다"는 의미가 숨어있지 않는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창암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이 글씨를 잘 아는지 모르지만 조선 붓의 헤지는 멋과 조선 종이의 스미는 맛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 (유홍준의 완당평전)
이와 다른 얘기도 있다. 추사가 전라감영에 들렸을 때 창암을 만나게 해 줄 것을 관찰사에게 청했다. 이에 관찰사는 창암을 만나도록 주선했다. 아무리 유배길이라 해도 오늘날 차관급인 병조및 형조참판을 지낸 인물이니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창암은 추사를 만나 밤을 새우며 서법과 서체를 논했고, 추사가 예를 다해 창암을 대하며 신필에 감탄하자 창암의 이름이 더욱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덧 8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1849년 1월, 유배에서 풀려난 추사는 귀경길에 전주에 들려 창암을 찾았다. 그러나 창암은 작고한지 3년이 지난 뒤였다.
그날 밤 창암의 제자를 만난 추사는 이런 말을 들었다.
"글씨는 한(漢)·위(魏)나라의 고전을 원전으로 삼아야지, 진(晉)나라 왕희지를 받들면 글씨가 형태만 예뻐지기 쉽다" 창암이 추사가 떠난 뒤 입버릇처럼 했다는 말이다. 이 글은 강암서예관에 소장돼 있다.
이 말을 들은 추사는 깨달은 바 있어'명필창암완산이공삼만지묘(名筆蒼巖完山李公三晩之墓)'라는 묘비를 쓴다. 그리고 "어질고 위대한 서가가 누워있으니, 후생들아 감히 이 무덤을 훼손하지 말지어다"는 묘문을 남긴다. 뒤늦게 창암의 진가를 인정한 것이다.
마침 창암을 기리는 휘호대회가 그의 출생지 정읍에서 열릴 예정이다. 평생 이 지역에 살며 조선 글씨의 진수를 보여준 명필의 예술혼이 새롭게 조명되었으면 한다.
/조상진 논설위원






 홈
홈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