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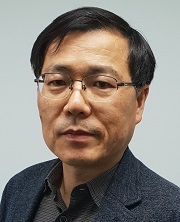
지구촌을 엄습한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의 많은 것을 되돌아보고 또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게 한다. 학교도 그렇다.
전국의 초·중·고교가 99일만에 등교수업을 시작했지만, 최근 곳곳에서 다시 중단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삼 학교의 역할을 되돌아보게 한다.
학사일정과 학생 건강 문제 등을 놓고 각 학교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터다. 하지만 코로나19와 상관없이 당장 학교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곳이 있다. 바로 전주 원도심지역의 작은 학교들이다. 한동안 잠잠했던 학교 통폐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불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이른바 ‘학교 총량제’가 발단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6년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을 내놓으면서 시·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신청할 경우, 신설 대체 이전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학교 재배치 계획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수 감소 추세가 계속되는 만큼 택지개발지구에 학교를 신설하려면 옛 도심이나 외곽의 작은 학교를 이전·재배치 형식으로 사실상 통폐합하도록 해 학교 수 증가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전주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학교 신설이 급했던 전북교육청은 신설 학교 개교 전까지 이 같은 학교 총량제를 이행하겠다는 조건부로 교육부 승인을 얻어 택지개발지구에 학교를 설립했다. 작은 학교 활성화 정책을 유지해 온 전북교육청은 당시 대선을 앞두고 정권이 바뀌면 이 같은 교육부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 같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책은 바뀌지 않았고, 당장 전주 에코시티에 초·중학교를 추가로 세워야 하는 전북교육청은 작은 학교 통폐합의 압박을 정면으로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학교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필수 공간이다. 지역 소멸이 꼭 농어촌만의 문제는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를 꼽는다면 단연 공약이기도 한‘도시재생 뉴딜’사업이다. 쇠락한 구도심을 재건축·재개발하는 과거의 도시개발 사업과 달리 지역의 기존 모습을 유지하면서 낙후한 도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거주자가 중심이 된 주거복지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회복, 도시의 활력을 찾고 사회통합까지 이뤄내겠다는 취지다. 공동체 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도 도시재생 사업에 어느 곳 못지않게 공력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옛 도심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경제논리를 앞세워 이 지역의 작은 학교를 없앤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게 뻔하다. 학교가 없는 곳에 젊은 세대가 눌러살 수 없는 노릇이다. 도시재생 사업을 명목으로 거액을 쏟아부어도 외관상의 생동감은 그려낼 수 있을지언정 지역공동체 회복이라는 궁극의 결과물을 얻어낼 수는 없다. 그럴듯한 구호와 포장으로 끝나는 도시재생이라면 과거의 재개발 정책과 다를 게 없을 것이다.
게다가 이는 온 마을이 나서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려는 원도심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다. 또 전북교육청이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작은 학교 활성화, 그리고 전주시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책과도 배치된다. 원도심이나 도시 외곽의 작은 학교가 없어진다면 해당 지역 공동체 붕괴현상을 부추겨 도시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지속적인 학생 수 하향곡선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일면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정책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획일적 판단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복원 등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
데스크창
“청곱창김 위기, 적극행정 없이는 산업도 없다.” 군산항, 감사원 문을 두드리다 군산항 존립,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롭다 상생에 앞서 군산항 활성화가 우선이다. 도내 항만의 주인은 누구인가 새만금항 신항 어설픈 개장으로 이미지 훼손될라 군산항이 무너져 가고 있다. 그런데..... 이차전지 폐수 처리수의 군산항 방류를 재고하라 군산항 활성화가 더욱 절실해졌다. “군산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정부 결단이 필요하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