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럼에 묻힌 아리랑
이종민 객원논설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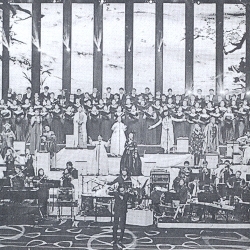
올해 소리축제가 아리랑으로 서막을 장식했다.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소리로서의 아리랑을 다양한 변주와 목소리를 통해 대규모 콘서트' 형태로 선을 보였다. 아리랑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 기획되었단다. 총연출을 맡은 프로그래머가 오랜 고심 끝에 내놓는 작품이라 기대가 컸다. 당일 관객들의 반응도 꽤 뜨거웠다.
그런데 기분이 영 찜찜하다. '아리 아리랑 소리 소리랑'을 내세웠는데 정작 아리랑을 느낄 수 없었다. 아리랑이 후렴구로는 들렸지만 그 고유의 한과 신명은 전해지지 않았다. 소리도 고함만 들렸을 뿐 우리 소리가 주는 아기자기한 흥과 맛은 귀를 씻고 들어도 느낄 수가 없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객석 의자까지 뒤흔드는 드럼의 강한 북울림만이 엉덩이를 통해 전해졌을 뿐이다.
세계적인 여성 보컬리스트들을 모았다며 사회자는 흥분을 했지만 정작 뛰어난 가창력만 선보였을 뿐 이 무대의 기획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 좀 더 삐딱하게 들으면 우리의 목소리 음악이 다른 나라의 것들에 비해 얼마나 열등한가를 보여주기 위한 무대라고 야유할 수도 있을 정도다. 그래서일까 정가 명인까지 막 소리를 질러대는 것이다!
기왕 목소리음악을 모으려 했으면 우리 판소리나 아리랑과 견줄 수 있는, 민족음악적 요소가 어느 정도는 남아있는, 음악의 연주자들을 초청했어야 했다. 뮤지컬이나 팜 가수가 아니라. 노래도 아리랑의 주제나 분위기와 비교할 수 있는 것들로 했어야 했고.
우리에게는 다양한 아리랑이 있다. 그러나 상주아리랑만 그나마 그 원형을 이해할 수 있게, 하지만 매우 초라한 형태로, 제시되었을 뿐 다른 것들은 무엇인지도 모르게 편곡(왜곡 혹은 해체?)되어, 그것마저 북소리에 묻혀 제대로 전해지지 못했다.
무대연출의 소박함(무대 변환이 거의 없고 출연자들이 전원 함께 올라가 물 마시며 자기 차례를 기다렸다. 가끔씩 박수를 치며!)이나 사회자의 감탄사와 미사여구에 사로잡힌 요령부득을 탓할 여유가 없다. 프로그래머나 집행위원장이 한 작품에 직접 참여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내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비판하기도 이제는 번거롭다. 이 지역 연주단들의 소외문제도 그렇고.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 철학과 정체성을 통해 우리 소리의 멋과 맛을 되새길 수 있다면, 그 진정성이라도 확인할 수 있다면, 용납할 수 있다.
여느 공연기획사도 선뵐 수 있는 무대가 소리축제를 대표하는 개막작이라니 아쉽고 안타까울 뿐이다. 이종민 객원논설위원






 홈
홈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