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마거릿 맥밀런 지음, 권민 옮김, 공존,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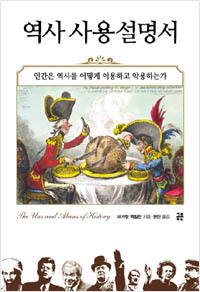
2001년 9월 11일 저녁, 미국의 작가 수전 제커비(Susan Jacoby)는 뉴욕의 한 바에서 우연히 두 남자의 대화를 엿들었다. 한 남자가 말했다. "이거 꼭 진주만 같네." 다른 남자가 물었다. "진주만이 뭐야?" 앞의 남자가 대답했다. "그건 베트남인들이 어느 만(灣)에 폭탄을 떨어뜨린 거지. 그래서 베트남 전쟁이 터졌잖아."
캐나다 역사학자 마거릿 맥밀런(Margaret MacMillan)의 「역사사용설명서: 인간은 역사를 어떻게 이용하고 악용하는가」(권민 옮김, 공존, 2009)에 소개된 에피소드다. 미국인들의 역사와 세계는 대한 무지는 악명이 높지만, '진주만'조차도 모른다는 게 쓴 웃음을 자아내게 만든다. 저자가 웃으라고 이 이야기를 꺼낸 건 아니다.
"이들이 이렇게 잘못 알고 있다고 문제가 될까? 나는 문제가 된다고 본다. 현재를 전후 사정과 함께 이해할 수가 없고 과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시민들은 역사적 지식과 교훈깨나 안다는 자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너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바에 있던 어리둥절한 두 남자가 진주만에 대해 제대로 알았다면, 그들은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공격이 1941년 미국에 가해진 일본의 공격과 같지 않다는 사실도 알았을 것이다. 전자는 테러 행위였고, 후자는 두 나라 간의 전쟁이었다. 그러니 전술과 전략도 전과 달라야 했다."
공감이 가면서도, 모든 미국인들이 진주만에 대해 잘 안다 하더라도 미국의 대(對) 9·11 테러 전략이 달라졌을까 하는 의문은 사라지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역사는 이미지와 느낌일 뿐이다. 역사의 오용과 남용은 피하기 어렵다. 역사교육을 잘 시킨다고 달라질 것 같지도 않다. 혹 인간의 한계와 관련된 생물학적 문제는 아닐까? 이 책을 읽으면서 내내 그런 생각이 들었다.
역사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 저자가 제시한 마커스 가비(Marcus Garvey, 1887-1940) 이야기를 들어보자. 가비는 1916년에 미국으로 건너간 자메이카인으로 아프리카에 독립된 흑인국의 창설을 추진하기 위해 전세계흑인진보협회(The Universal Negro Improvement Association)를 조직한 인물이다. 그는 1932년에 쓴 '흑인은 누구이고 무엇인가?(Who and What Is a Negro?)'라는 논쟁적인 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편견없는 역사학도라면 누구나 흑인이 한때 세계를 지배했음을 안다. 그때 백인들은 동굴 속에 사는 야만인이자 미개인이었다. 또 편견없는 역사학도라면 누구나 당시 학문의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대학들에서 흑인 교수 수천 명이 가르쳤다는 것도 안다. 세계의 문명이 고대 이집트에서 탄생했다는 것도 안다. 그리스와 로마가 이집트에서 기술과 문자를 빼앗아 응당 이집트의 몫인 명예를 모두 가로챘다는 것도 안다."
이 주장에 대해 저자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아직도 거론되고 있는 그의 주장에 따르면, 문명이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이집트로 전달됐다가 도둑질을 당해 그리스와 로마로 넘어간 횃불과 같다. 그것은 문명이 한 국민에서 다른 국민으로 전달될 수 있다고 하거나 오직 하나의 '문명'만 있다고 보는 괴상하고 정적인 문명관이다. 실제로는 많은 문명이 있고 과거에도 줄곧 있었으며, 또한 유동적이어서 계속 변하고 있다. 이런 문명을 형성하는 힘은 안에서도 나오고 밖으로부터도 온다. 물론 그리스 문명이 외부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이집트의 영향보다는 동양의 영향을 더 받았을 것이다."
저자의 반박이 훨씬 설득력이 높지만, 중요한 것은 당시 인간으로서의 주체의식이 없거나 약했던 흑인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주기 위한 가비의 목적일 것이다. 목적이 정당하니 사실 왜곡이나 과장이 괜찮다는 게 아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 이 세상의 수많은 약자들이 좋은 목적을 위해 어느 정도의 사실 왜곡과 과장을 하고 있다. 약자가 하는 왜곡과 과장은 괜찮다는 게 아니다. 약자들이 절박한 상황에서 논문을 쓰듯이 역사에 엄정한 자세를 갖기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다.
역사적 인물의 성격 분석은 어떻게 볼 것인가? 지크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미국 외교관 윌리엄 불릿(William Bulitt)과 함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전기를 쓴 적이 있다. 이 전기에서 프로이트는 윌슨의 '아버지 콤플렉스'를 지적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친구들이 백악관을 방문해 아버지와의 추억담을 꺼내면 윌슨은 그 자리에서 줄줄 눈물을 흘리곤 했다나. 한국인에겐 윌슨의 지극한 효심을 말해주는 미담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서양인들의 관점에선 보통 심각한 병이 아니다. 프로이트는 이런 사례들을 근거로 윌슨의 외교정책까지 평가하는 등 너무 상상의 나래를 편 나머지 비판을 많이 받았다. 이 책을 나쁜 역사서의 사례로 지목한 저자는 프로이트가 이 책으로 "자기 명성에 오점을 남겼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프로이트는 윌슨을 만난 적이 없었다. 또 윌슨의 사사로운 일기를 읽은 적도 없었다. 윌슨은 일기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아버지와 패배감에 대한 윌슨의 강박관념을 자신있게 이야기했다."
이게 의외로 재미있는 이야기다. 한국처럼 대통령 권력이 막강하고 국민의 '지도자 추종주의'가 심한 나라에선 대통령의 성격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일어나 온갖 고초와 시련을 겪고 자수성가한 노무현과 이명박의 성격적인 공통점에 주목하는 이들이 많다. 물론 그들의 성격이 국정운영 스타일에 그대로 반영돼 온갖 평지풍파를 일으켰기 때문이리라. 그렇지만 여기에도 한가지 딜레마가 있다.
우리는 '소신·신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고집·아집'은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 없다! 결과가 좋으면 '소신·신념'이요, 나쁘면 '고집·아집'이다. 역사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식의 결과론이다. 역사의 오남용이 저질러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도 하다.
지도자에 대한 대중의 지지라는 것도 연예인 팬클럽의 지지와 비슷한 점이 많다. 특정한 이념과 정치적 성향 때문에 누굴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다를 게 없다. 평가의 기준에서 자신의 스타에 대해 무한정 너그러워지기 때문이다. 1962년 여론조사 전문가 조지 갤럽은 왜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중요한 정책 실패를 했는데도 지지도에 타격을 입지 않았는가를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사람들은 목표가 무엇이며 무엇을 하려고 애썼는가에 의해 어떤 사람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꼭 그 사람이 무엇을 성취하고 어떻게 성공했는가에 의해 평가하는 건 아니다."
역사의 오용과 남용을 경계하는 건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소녀시대'를 좋아하건 '원더걸스'를 좋아하건 각자 자유다. 취향을 존중해야, 대화가 된다. 역사는 물론 정치를 연예로 보는 게 속도 편하거니와 국리민복에도 도움이 된다.
"어떻게 저런 인간을 좋아할 수 있지?"라고 진지해지면 이 세상 자체가 싫어지는 수가 있으니 조심할 일이다.
/강준만(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