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박태건 시인 - 박수서 시집 '갱년기 영애씨'
에코의 숙명으로 부르는 계면조의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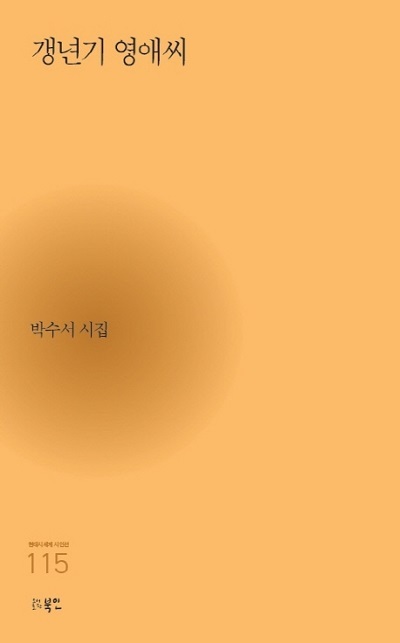
아내가 밤마다 사라진다.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 나 혼자 누워 있다. 거실에 나왔다가 소파에 잠든 아내를 보게 된 것은 얼마 전부터다. 밤새 아내는 어디로 다녀온 것일까? 혼자 깨는 아침이 늘어나면서 나는 아내의 꿈이 궁금하다. 분명 그녀와 나는 생의 중요한 고비를 넘고 있다. 갱년기다.
박수서의 여섯 번째 시집 <갱년기 영애씨> 는 중년의 ‘다시 겪는 사춘기’ 이야기다. 사는 일이 자꾸 삐걱거릴 때, 그래서 간신히 견디는 일상의 무사함이 고맙게 느껴질 때 이 시집을 읽어보자. 사춘기는 신체와 정신이 재구성되는 시기. 이때 겪는 성장통은 다음 한 세대를 견디게 하는 예방주사다. 생활인으로 살아온 중년의 시인은 갱년기를 겪으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다음 시간을 준비 한다. 시인은 시간의 불안함을 견디는 존재일까?
<갱년기 영애씨> 는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시적 버전이다. 시집 곳곳에서 순수했던 시절을 호명한다. 시인의 사랑은 때론 “너무 무겁고”(‘주문진항’) “자꾸 삐걱거려도”(‘마흔일곱’) 살아야 하는 법을 배운다. 갱년기는 한때 눈부셨던 초록의 기억을 조금씩 꺼내 먹으며 살아야 견딜 수 있는 시기인지도 모른다.
주말 부부인 시인은 월요일은 혼술 하고 금요일에는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탄다. 혼자 견뎌야 할 일주일을 혼술로 달래는 갱년기는 ‘지독히’ 외롭다. 그래서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젖어 있다. ‘지금’. ‘여기’. ‘없는’, ‘사아랑은 눈물겨운 삶’을 견뎌야 하는 것이니까. 생각건대 박수서 시인은 사랑이라는 닻에 자신을 묶어두고 산천을 떠도는 에코의 숙명을 가졌으리라.
시인은 경험한 것에서 상상하고 상상하는 것에서 성찰한다. 평생 다른 사람의 등만 보고 살아야 하는 사람의 숙명을 시인은 ‘아프다’고 고백한다. 그런데 이 비애야말로 시인이 발견한 사랑의 문법이 아닌가? 내가 알기로 ‘애달픈 사랑아 그래도 어떡하니?’라는 문장을 시에 담은 시인은 지금까지 없었다. 한국시가 발견한 눈물의 또 하나의 경지가 여기에 있다.
이번 시집에는 먹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먹는다’는 것은 곧 ‘산다’는 것이다. 그의 시에는 삶의 비린내가 물씬 풍긴다. 이 냄새는 갱년기를 넘어서는 삶에 대한 강한 긍정의 표현이다. ‘아, 오늘 하루도 잘 먹었습니다’라는 말이 왜 이리 아프게 들리는 걸까? 시인의 절창인 “흑백영화처럼 눈이 내리고 부글부글 홍합탕은 끓고 있어라”가 어울리는 계절이 기다려진다.
* 박태건 시인은 1995년 전북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서 ‘가족사’로 등단했다. 시화집 <봄, 기차> , 산문집 <나그네는 바람의 마을로> , <사람의 마을에 꽃은 피고> 등을 냈다.
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황보윤 소설가-황석영 ‘할매’ 김영주 작가- 김헌수 ‘내 귓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 날’ 이경옥 동화작가-이라야‘파이트’ 오은숙 소설가-이희단 ‘청나일 쪽으로’ 기명숙 작가, 지연 ‘모든 날씨들아 쉬었다 가렴’ 이진숙 수필가-하기정 ‘건너가는 마음’ 장은영 동화작가-윤일호 ‘거의 다 왔어!’ 이영종 시인 - 황유원 시집 ‘하얀 사슴 연못’ 장창영 작가- 징 지글러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최기우 극작가-정양 ‘헛디디며 헛짚으며’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