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기명숙 작가- 임후남'나를 아껴준 당신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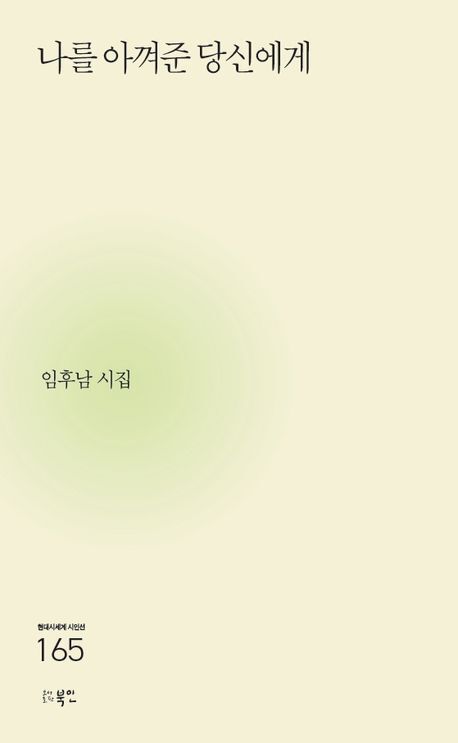
임후남 선생님 『나를 아껴준 당신에게』 북토크에 참여했다. 책갈피처럼 가지런히 접혀있던 독자들이 시를 낭송하고 작가와의 인연과 작품에 대해 말하는 연대의 장이었다. 선생은 용인에서 ‘생각을 담는 집’이라는 시골 책방을 운영하고 있다. 전주를 떠나 타향에서의 객창감이 잦아들지 않을 무렵 찾아간 곳이었다. 고요의 질감 속 책과 식물에 둘러싸인 맑고 단정한 사람, 그렇게 선생과 인연을 맺었다.
임후남 선생의 작품들은 장르를 불문 삶의 양식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느린 여백의 시간과 필요한 만큼의 적요, 자연 친화적인 공간에서의 작고 연약한 것들과의 상호 작용이 그것이다. 그녀의 처소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어서 위계 없이 평화롭다. 선생은 언뜻 시골 후미진 책방에서 고립된 존재처럼 보이지만 꽃나무 풀들의 뿌리가 땅속에서 엉켜있듯 수많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오랜 도시 생활에서 체득한 방식을 버리고 동안 꿈꿔왔다던 ‘나만의 방’에서 타자의 삶을 보듬는 플랫폼으로 기인한다. 책방에 들르는 사람, 꽃나무와 보리와 들깨와 낡아가는 책들에 귀를 기울인다. 『나를 아껴준 당신에게』는 그것에 대한 기록이다. 작품들에서 상실한 자의 목소리, 떠나온 자의 슬픔을 발견하곤 한다. 인간 실존에서 상실과 분리는 시 공간의 이격에서 오는 당면과제다. 그런데 이 시집은 쇠락의 운명일 게 분명한 자연과 인간을 슬픔과 상실로만 규정하지 않는다. 시 전편을 관통하는 실존방식과 무한 애정은 ‘상처와 실패’를 곱씹는 자에게 존엄성 회복에 도달하기 위한 연료 공급처로 기능한다.
누군가 “나무들이 내뿜는 기호에 민감한 사람만이 목수가 된다”라고 하였다. 자연 기호에 매혹되고 예민한, 직접 체득에서 나오는 선생의 감응 능력이 시적 언술로 그치지 않고 확장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나 또한 균열 된 세계로부터 위로를 찾아 숲속 책방을 찾아간 것이었으니 돌올한 선생의 ‘덕목’임이 분명하다. 한편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는 고통의 복판에서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노인과 실직자와 쇠락한 집과 희미한 유년기의 기억 등을 현학과 자의식 과잉 없이 드러낸다. 언어실험이니 한방에 녹다운시키려는 언어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지 않고 매화 꽃망울이 터지듯 툭툭, 던지는 말의 오묘함이 있다.
시집을 읽는 내내 선생의 관계망 속에 긴밀히 연결됐다는 안도감과 더불어 취약한 존재라는 것을 들켜도 부끄럽지 않게 된다. 시인의 말에서처럼 “삶의 풍경은 저마다의 계절이 있고” 아픔은 균등 배분되지 않고 각자 몫으로 견뎌내야지만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다시 봄이 올 것”이니까.
북토크에서 나는 「시인」을 낭송했다. 삶의 전장에서 “김밥을 말고 소주를 마시며 그냥 아줌마로 불리는” 시를 접어버린 이와 반대 값인 “쉰에 시인이 된 그는 육십 넘은 지금 김밥집에서 김밥을 말고 있다 (중략) 김밥을 말다 시가 튀어나오면 얼른 볼펜을 집어 들었다 (중략) 사람들은 그를 시인이라고 불렀다.” 시인으로 산다는 것이 불균형적이고 도구적 측면에서 무용하대도 진정한 시인으로서의 추동 방식은 다르다. 이질적인 두 사례의 향방에서 나는 어디쯤 있는 것이냐! 힘든 사연도 말하고 나면 고통이 줄어든다. 선생은 아픔과 슬픔 견딜 수 없는 그리움까지 털어놓게 한다. 선생의 수필집 『책방 시절』과 『나는 괜찮아지고 있습니다』에서도 일관된 메시지가 있다. “나와 이웃한 삶에 자꾸 귀 기울이”는 선생이 넌지시 묻고 선생에게 위로받았던 나는 대답한다. “나는 이제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기명숙 작가는
전남 목포 출신이며, 2006년 전북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시집으로는 <몸 밖의 안부를 묻다>가 있다. 현재 강의와 집필에 몰두하고 있다.
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황보윤 소설가-황석영 ‘할매’ 김영주 작가- 김헌수 ‘내 귓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 날’ 이경옥 동화작가-이라야‘파이트’ 오은숙 소설가-이희단 ‘청나일 쪽으로’ 기명숙 작가, 지연 ‘모든 날씨들아 쉬었다 가렴’ 이진숙 수필가-하기정 ‘건너가는 마음’ 장은영 동화작가-윤일호 ‘거의 다 왔어!’ 이영종 시인 - 황유원 시집 ‘하얀 사슴 연못’ 장창영 작가- 징 지글러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최기우 극작가-정양 ‘헛디디며 헛짚으며’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