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회 혼불문학상 수상 박혜영 작가 〈비밀정원〉 양반 모습으로 채운 한 시대의 빈 퍼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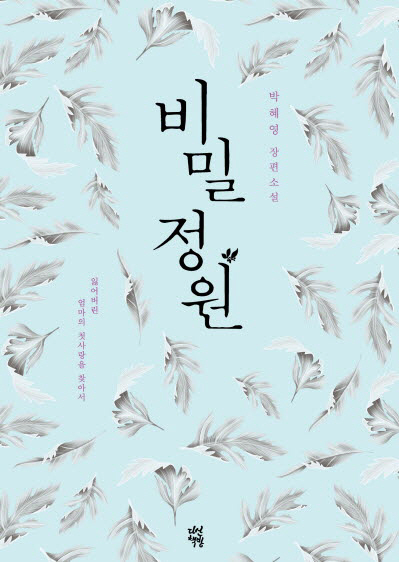
소설 〈비밀정원〉은 화자인 이요의 23살까지를 쓴 소설이다. 이 소설은 주인공이 성장하는 1960년대와 1970년대를 지나 1980년대 초반까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 시대는 전쟁 후 급격히 들어온 서구 문화가 봉건의 잔재와 혼재하고 유교적 질서가 생활과 관습에 잔존하고 한편으로는 민주와 자유의 물결이 냉전의 이념과 대치하고 있었던 때다. 그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이 소설은 노관이라는 강원도 지방의 한 종가를 중심으로 등장인물들의 성장과 사랑, 우정을 그렸다.
‘노관’이라는 종가에서 할머니는 종가의 대를 잇기 위해 폐결핵을 앓는 병약한 장자의 결혼을 서두른다. 상대 집안의 선거 빚과 가세의 몰락으로 빠르고 강력하게 혼사를 결정하고 진행하나 거기에는 연인의 애달픈 이별이 잠복해 있다. 남은 연인의 긴 구애와 사랑, 이루지 못하고 마는 애절한 운명, 그리고 아이들의 성장 이야기가 슬프고 아름답게 펼쳐진다.
이 소설에서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한 시대를 살고 사라져 간 사람들의 발자취를 남기고 싶었다. 역사가 선으로, 연대기로 그 기록을 남긴다면 예술과 문학은 그 역사라는 테두리 안에 그 내용물을 채워가는 일이다. 역사적인 큰 줄기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두는 일, 향기를 내는 일이 예술이고 문학이 아닐는지.
근대소설이 민중과 소외된 자, 소수자에게 특별히 많은 관심을 기울인 바가 있지다만 그들과 똑같이 그 시대에 존재했을 양반, 상층민의 관심은 오히려 배제되었다. 양반은 〈양반전〉, 〈삼대〉, 〈태평천하〉, 〈대하〉 등에서 풍자나 야유의 대상이었지 그들의 심중을, 사고를 제대로 드러낸 소설이 드물었다. 양반은 부패한 기득권층이고 명분 위주의 무기력한 층으로만 폄하되기도 했지만 그 평가가 적절한 면도 있다.
그 시대의 빈 퍼즐을 채우고 싶었다. 그래서 양반가에 주목했다. 그들의 삶의 양식과 사고방식, 관습과 분위기를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었다. 1960~70년대 한학자 양반가에서 성장해 그런 배경 설정에 자신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가장 익숙한 시간과 공간을 이용한 셈이다.

이 소설 속 인물들은 그들만의 시간 속에서 영원히 산다. 독자가 책을 펼치고 말을 걸 때야 비로소 그들은 세상과 대화를 한다. 한 시대에 대해 예술가들이 많이 이야기할수록 그 시기의 그림은 더욱 세밀해지고 선명해진다. 한 역사적 시대를 악보로 더욱 많은 노래들이 연주되었으면 한다.
좋은 책의 기준은, 읽기 전의 자신과 읽고 난 후의 자신이 뭔가 달라지는 것이라 한다.
〈비밀정원〉을 읽고 난 뒤 무언가 달라져 있기를 현명한 독자들에게 기대해 본다.






 홈
홈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