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버빌가의 테스...김명신 옮김, 대교베텔스만,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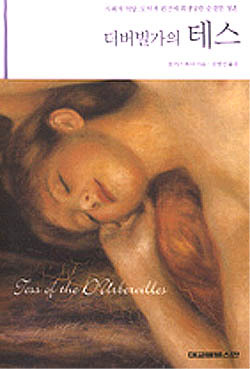
내가 『테스』를 처음 읽은 것은 아마도 중학생 때였던 것 같다.
그때는 컴퓨터라든가 핸드폰 같은, 요즘 아이들에게는 너무도 흔한 오락거리가 없었던 시절이다. 텔레비전은 꽤 많이 보급되어 있었지만 내가 중학생 때는 우리 집에 아직 텔레비전이 없었다.
뚜렷한 오락거리가 없던 우리 형제들의 유일한 낙은 딱 한가지였다. 책방에서 책을 빌려보는 것(물론 만화를 포함하여). 언니들이 빌려보는 세계고전문학 작품들을 나도 덩달아 빌려보았다. 그러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니 『부활』같은 작품들이 내게 쉬 이해될 리가 없었다. 명작이라니까, 그리고 언니들이 읽으니까 나도 폼 잡느라고 읽어넘겼을 뿐 특별히재미가 있었다거나 기억에 남는 작품은 별로 없다. 그런데 그 와중에 유독 나의 기억에 선명히 남아 있는 작품이 바로 『테스』다.
톨스토이나 괴테의 작품처럼 방대하거나 심오하다기보다 오히려 약간 통속적인 느낌이 나는 이 소설이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나의 심금을 울린 것은 무엇보다 이 작품이 애틋한 연애소설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가난한 집안의 아름다운 처녀 테스와 존경받는 목사집안의 이단아 에인절의 지고지순한 사랑, 그리고 테스의 순결을 빼앗고 기어이 살인까지 저지르게 함으로써 이들의 사랑을 훼방놓고 마는 무뢰한 알렉, 이 세 명의 인물이 엮어내는 운명의 장난에 가슴 졸이며 밤을 새워 책을 읽던 기억이 선명하다.
그때는 테스가 어떻게든 알렉의 마수에서 벗어나 에인절과 맺어지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책을 읽었다. 테스가 결혼식 전날 밤 에인절의 방문 밑에 넣어둔 자신의 과거(처녀성을 상실하고 사생아를 낳았던 일)를 고백하는 쪽지가 무사히 전해지기를, 그리고 에인절이 테스를 용서해주고 받아들여주기를 얼마나 안타깝게 바랐던가.
그런데 삼십여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다시 읽는 『테스』는 무척 다르게 다가온다. 순결을 잃은 여자에게 1800년대 말의 영국 사회는 얼마나 엄격하고 혹독했던가를 대변하는 인물이 바로 에인절이며, 가난한 농부의 딸에게 유일한 생존전략은 처절한 노동 아니면 부유한 남성과 운좋게 결혼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통렬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설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여성에 대한 이런 편견과 굴레가 비단 한 세기 전의 영국 농촌에만 해당되는 일일까? 우리 사회의 가난한 딸들은 과연 테스보다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 그들이 순결을 잃었으되 더 나은 계층의 남성과 결혼하고자 할 때, 그들이 비빌 언덕 하나 없이 가족의 생계를 오롯이 책임져야 할 때, 우리 사회는 테스가 살던 시대보다 더한 아량과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 있는 것일까? 혹은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예쁘고 발랄하기만 하면 백마 탄 왕자가 정말 나타날 것이라고 은근히 속삭임으로써 현실 속의 숱한 테스들의 정당한 분노와 투쟁의지를 애써 잠재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몇 해 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끈 TV 드라마 <파리의 연인> 에서 나는 신데렐라 스토리의 완벽한 한국판 재현을 본다).
신데렐라가 되어 헛된 꿈을 꾸든가, 테스가 되어 비극적 종말을 맞든가, 가난한 딸들의 길이 이렇게 단 두 가지라면 그건 너무 절망스럽다. 더 나은 길, 더 건강한 길을 찾아내기 위해서라도 이 오래된 연애소설 『테스』는 다시 한 번 읽을 가치가 있다.
책의 향기
송하선 교수, 신석정 평전 '그 먼나라를 알으십니까' 펴내 박희주 소설집 '내 마음속의 느티나무' 시한부 인생 그녀가 세상으로 걸어 나왔다 현대사회의 내면적 상처 그려…윤규열 소설 '가을 망둥어' 힘겨운 생 앞에서 나를 일으켜준 '시간' 詩로 임진왜란·병자호란 역사 재조명 "노자는 정치론이나 처신술이 아니다" "진실은 현장에 있다" 지론 생생 해외여행서 만난 '서로 다름'…아하! 장세진 산문집 '깜도 안되는 것들이'…학교현장 문제 등 날카롭게 꼬집어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