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인호 '유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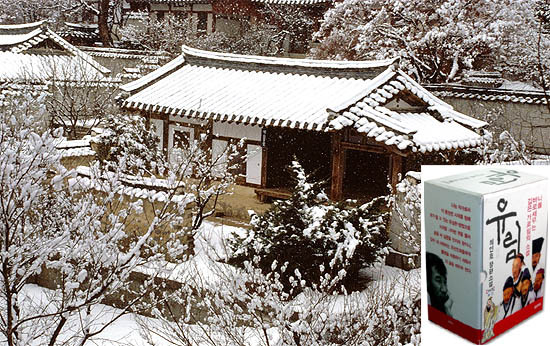
유림(儒林), 그 울림이 좋은 숲을 주유하며 많은 생각을 주어올리고 많은 반성의 한숨을 내쉬어야 했다. 크게 이루신 공자님 이야기만 해도 그러할 터인데 노자, 맹자, 안자, 주자, 거기에 극적인 삶을 살았던 조광조, 그리고 율곡, 퇴계 선생의 삶과 사상까지 담고 있으니 불민하고 게으른 후학으로서야 탄식을 동반한 끊임없는 뒤돌아봄 말고 다른 무슨 반응을 보일 수 있겠는가?
전통문화를 운위하면서도 항상 마음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허함을 떨칠 수 없었다. 화려하게 꽃피운 (지금은 그 초라한 자취만 어렴풋하지만) 우리들 전통문화의 정신적 뿌리 혹은 그 실한 사상적 줄기를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기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막연하기만 했기 때문이다.
불교와 더불어 “우리 민족의 핏속을 흐르는 또 다른 원형질”인 유교에 관한 소설에의 초대에 서둘러 응한 것은 이런 갈증과 기대 때문이었을 것이다.
과연 최인호였다! 조광조의 적려유허비를 찾아가는 처음 대목에서부터 곡부(曲阜)기행으로 마무리되는 마지막 부분까지, 『사기』,『시경』등에 이르는 고전 그리고 수많은 문집들에 대한 그의 거침없는 섭렵 인용은 혀를 내두르게 한다. 번역이 되어있는 사서삼경이나 조선왕조실록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수많은 시들을 서사의 틀에 얽어 넣는 솜씨라니! 더구나 매일 내몰려야 하는 신문연재소설에!
천인무간(天人無間), 고궁(固窮), 위기지학(爲己之學), 화이부동(和而不同), 거경궁리(居敬窮理) 등의 성어는 물론이요 정치사회적 상황과 개인의 삶까지 뒤돌아보게 하는 글귀들이 하도 빈번하여 애초부터 밑줄 긋기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퇴계와 율곡이 주고받은 몇 통의 편지로 단 한번의 만남을 ‘우주적 조우(遭遇)’로 승화시키는 놀라운 상상력!
그 상상력은 퇴계와 두향의 관계에 관한 부분에서 그 절정에 달하는데, 이 대목은 분명 지나침이 미치지 못함만 못하다(過猶不及). 소설적 재미를 더하기 위한 것이고 작가 자신의 변명대로 책이 ‘살아 있는 생물’로서 완간 후 끝없는 교정과 보완을 통해 완성된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아쉬움은 남는다. 공자, 석가, 예수의 비교가 빈번하게 끼어드는 것도 소설적 흐름을 상당히 방해한다. 적어도 ‘선비사상’을 주축으로 하여 우리의 ‘국격’을 찾기 위해 “공자의 혼을 불러들이고, 이퇴계와 조광조를 초혼”했다는 진정성을 기대한 독자에게는 별무효용의 사족 혹은 마감에 쫓겨 헤어나지 못한 중언부언쯤으로 읽히는 것이다.
그래서 “과연 최인호였다!”는 이중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광대무변의 섭렵과 때로는 지나쳐 넘치는 상상력, 이를 토대로 한 ‘대담하고 거침없는 문장’, 그리고 진지함을 요하는 소재를 대중적 취향으로 적당하게 버무릴 줄 아는 능청까지.
신비한 매력을 지니고 있으면서 가끔 어이없이 헤픈 웃음을 머금은 여인 같아 보이기도 하는 이 소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엄청난 내공으로나 가능한 2천5백년 동양사상에 대한 대주유기이다. 그 ‘넘침’을 눈감아 줄 수 있다면 누구나 “혼탁한 현실을 걸러주는” 굵고 환한 빛줄기 하나 이곳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퇴계의 사상보다 그의 “얼굴이 그려진 화폐를 더 사랑”하는 천민자본주의를 실용주의라 호도하는 정치구호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일독을 해야 할 우리시대의 고전인 것이다.
/이종민(전북대 교수)
책의 향기
송하선 교수, 신석정 평전 '그 먼나라를 알으십니까' 펴내 박희주 소설집 '내 마음속의 느티나무' 시한부 인생 그녀가 세상으로 걸어 나왔다 현대사회의 내면적 상처 그려…윤규열 소설 '가을 망둥어' 힘겨운 생 앞에서 나를 일으켜준 '시간' 詩로 임진왜란·병자호란 역사 재조명 "노자는 정치론이나 처신술이 아니다" "진실은 현장에 있다" 지론 생생 해외여행서 만난 '서로 다름'…아하! 장세진 산문집 '깜도 안되는 것들이'…학교현장 문제 등 날카롭게 꼬집어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