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백년을 살아온 작은 마을 진메, "그곳엔 오래된 우리의 미래가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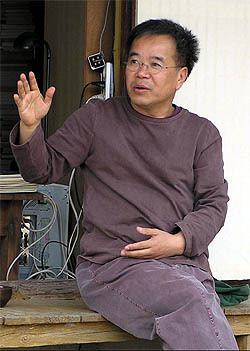
'삼십칠명의 장정들과 삼십칠명의 아낙네들이 삼십칠채의 지붕 아래 식구들을 거느리고 오백년을 살았던 마을에 다섯명의 노인 내외와 홀로 사는 어머니들의 밤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멀고 얼마나 캄캄한가.'
때로는 적막이 마을을 덮는 곳. 하지만 하루의 노동이 산천과 함께 찬란하게 빛나던 때가 있었다.
오래전부터 같이 먹고 일하면서 놀았던, 진메마을 사람들의 삶을 전해온 김용택 시인(61)이 다시 진메마을 이야기를 한다.
2008년 8월, 38년 만에 임실 덕치초등학교 2학년을 완전히 졸업하고 학교 밖으로 나온 그가 처음으로 펴내는 산문집, 「오래된 마을」(한겨레출판)이다.
절망스럽고 아픈 농촌의 현실이지만, 그는 "절망의 끝이 늘 희망의 실마리에 닿아있듯, 최첨단은 가장 오래된 가치에 닿아있다. 가장 오래된 가치는 본래 있었던 것들"이라며 자연과 공동체가 던져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채집한다.
"내 육체는 마을 흙으로 빚어졌고, 내 피는 그 강물입니다. 내 노래는 그 강가에 사는 사람들의 일과 놀이 속에서 그들의 입을 통해 세상에 나왔습니다. 내 핏줄은 그 강물로 이어져 있어 그 강물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그 땅이 아프면 내 몸이 아픕니다. 그 강물이 울면 나는 강물을 뒤로하고 돌아앉아 산을 안고 울었습니다."
뿌리를 잃고 부유하는 현대인들의 원형이 그들이 나고 자란 공동체 속에 살아숨쉬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글들. 그는 "가난하나 따사로운 햇살과 싱그러운 바람을 매만지는 손이 있고, 그 아름다운 손으로 땅에 씨를 묻는 화사한 얼굴들이 아직도 세상을 지킨다. 그 오래된 작은 마을 사람들의 변하지 않은 공동체적인 삶이 인류의 미래다"고 말한다.
"예술은 설명이 아니고 감동이지요. 감동은 일상에서 옵니다. 일상의 존중을 모르는 예술작품들은 억지지요. 일상의 재구성을 통한 긴장된 새로운 세계의 창조가 예술일 때, 공감을 넘어선 감동이 일지요. 감동은 생명 그 자체지요."
'문학 병'이 들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간만 빼고 책을 읽던 날들. 어느날 시를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시인은 덕치초등학교를 "나의 문학과 인생의 학교였다"고 말한다.
시인을 대표하는 '섬진강' 연작이 쓰여진 날에 대한 기억도 있다. 외롭고 쓸쓸한 밤이면 방을 나와 숙직실 앞에 서서 눈물 가득 고인 그렁그렁한 마을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섬진강'을 썼다. "어느날 일기장을 보니 그날이 1981년 11월 21일이었습니다. <섬진강1> 을 써놓고 온몸이 떨리던 그때를 내 어찌 잊겠습니까. 어디 앉아 있을 자리가 없어서 나는 찬바람 부는 운동장을 달렸지요. 그 잠 못 들던 겨울밤이 생각납니다. 그때까지 문학에 있어서 나는 정말 캄캄하게 혼자였으니까요."
운동장에서, 골목길에서, 동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사라진 나라, 국가의 힘이 점수의 힘이 아니라 진정한 교육의 힘이라는 것을 잊고사는 나라에 대한 염려도 적어두었다.
이름이 알려진 후에도 시골을 떠나지 않고 어머니와 고향을 지켜온 시인. 여전히 그는 촌스럽고, 그 촌스러움으로 세상과 마주한다.
책의 향기
송하선 교수, 신석정 평전 '그 먼나라를 알으십니까' 펴내 박희주 소설집 '내 마음속의 느티나무' 시한부 인생 그녀가 세상으로 걸어 나왔다 현대사회의 내면적 상처 그려…윤규열 소설 '가을 망둥어' 힘겨운 생 앞에서 나를 일으켜준 '시간' 詩로 임진왜란·병자호란 역사 재조명 "노자는 정치론이나 처신술이 아니다" "진실은 현장에 있다" 지론 생생 해외여행서 만난 '서로 다름'…아하! 장세진 산문집 '깜도 안되는 것들이'…학교현장 문제 등 날카롭게 꼬집어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