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정한 마음이 빚어낸 절제된 언어·단아한 율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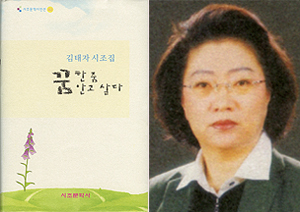
자식들 웃는 날보다 걱정의 날이 많았던 어머니. 나이가 들어가면서 숫자와 모양만 달랐지 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 가슴이 아린 날 어머니가 잠 못 이루며 집 마당을 서성였듯, 그도 고독이 엄습해올 때면 어머니를 떠올렸다. 순간순간이 시의 근원이 됐다. 그나마 마음 다잡고 하소연할 수 있는 대상은 시조 뿐. 시조시인 김태자(63·전주대 교수)씨가 세번째 시조집 「꿈 한 줌 안고 살다」(시조문학사)를 펴냈다.
"퇴임 후 무엇을 할까 궁리해봤지만, 선뜻 답이 안 나왔어요. 커피숍이나 차릴까 고민해봤지만, 주변에서 퇴임 후 일 꾸미는 사람 치고 말아먹지 않은 사람이 없다며 겁을 주더군요. 답이 안 나와 그냥 아는 것이나 풀어쓰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6년간 준비했던 글이지만, 거의 새로 쓰다시피 했다. 율격을 바로 잡기 위해서였다. 많은 이들이 시조의 현대화를 외치지만 절제된 언어, 단아한 시조 율격을 고집했다.
"시조는 시와 다르죠. 시조의 율격으로 읽는 색다른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조는 시가 될 수 있지만, 시는 시조가 될 수 없습니다. "
대구 출생인 그는 1974년 결혼 후 전주에 왔다. 장녀로서 어머니를 두고 온 게 늘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생활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쉼 없이 계속됐다. 강의하고, 수업 준비하고, 집안일 하고, 논문에 대한 압박감에 시달렸다. 논문에서 해방되려나 싶으니 이제는 정년이 가까워졌다.
"나이가 들면서 운명이란 게 있다는 걸 믿게 됐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이킬 수 없는 병에 걸리고, 모자람 없는 이가 하루 아침에 유명을 달리하고. 어쩌면 인간의 삶은 예정된 디스켓의 한 회로를 풀어가는 게 아닐까 싶어집니다. 그 회로를 축으로 목적지까지 이래저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요."
김 교수는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태도를 배우게 됐다"며 "마음의 눈을 달리하면 같은 상황도 달리 보이듯 시조를 쓰면서 마음의 평정을 찾게 됐다"고 했다.
이화여대 국문과와 동대학원 국문과를 졸업한 그는 1990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 '제22회 한국시조문학상 수상(2004)'을 수상했으며, 시조집 「해거름의 강을 지나」(1998), 「산 강 들풀이 되어」(2004) 등을 펴낸 바 있다.
책의 향기
송하선 교수, 신석정 평전 '그 먼나라를 알으십니까' 펴내 박희주 소설집 '내 마음속의 느티나무' 시한부 인생 그녀가 세상으로 걸어 나왔다 현대사회의 내면적 상처 그려…윤규열 소설 '가을 망둥어' 힘겨운 생 앞에서 나를 일으켜준 '시간' 詩로 임진왜란·병자호란 역사 재조명 "노자는 정치론이나 처신술이 아니다" "진실은 현장에 있다" 지론 생생 해외여행서 만난 '서로 다름'…아하! 장세진 산문집 '깜도 안되는 것들이'…학교현장 문제 등 날카롭게 꼬집어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