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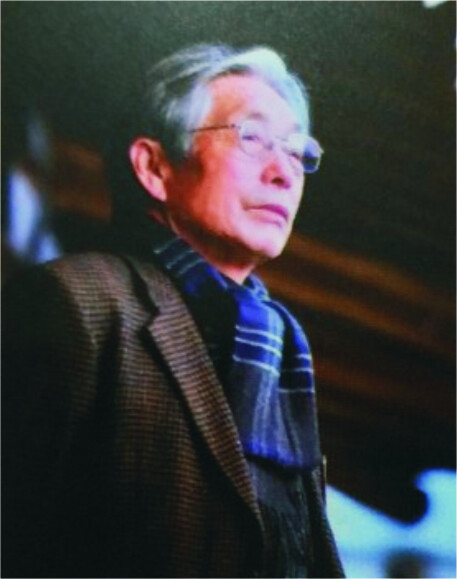
벼이삭도 이젠 누렇게 더욱 고개를 숙이고 있다. 늘 걷는 산책의 길이지만 이 논두렁길을 걸어 온 것도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다.
이제는 주위의 환경 그리고 오늘날 사회상의 아픔에 대해서 종종 글로써 표현해 보는 것이 버릇처럼 되어버렸다. 그것이 시(詩)든 수상(隨想)이든 칼럼이든 그 장르에 대한 이론이나 기법 같은 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다만 내 감정이 주위의 환경에 부딪치고 내가 살아가는 길목에서 시대와 사회에 대한 느낌이 있게 되면 그것을 글로써 표현해 보는 것이 나에겐 시가 되기도 하고, 수상이나 칼럼이 되기도 한다. 반평생 교육사(敎育史)의 길을 걸어오면서 문학의 거리를 산책한다는 것이 어쩌면 외람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거리를 가볍게 산책해 보는 것도 나에게 퍽 의미 있는 일이라고 늦게 깨닫고 있을 따름이다.
지금 나는 5대째 내려오는 지방문화재인 고택에서 형처(荊妻)와 단둘이 살면서 자그마한 텃밭과 논 몇 마지기를 지으며, 책을 읽고 또 쓰는 일을 해오기 있다. 이것이 우리 가정사에서 보면, 금년인 서기 2023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집에서 가까이는 5대째 대물림으로 농사를 지어오는 셈인데, 간단없이 164년째의 농사일이며, 또한 사랑방에서 책을 보아온 것도 가까이는 역시 5대째164년째 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의 역사적인 공간 속에서 나는 삶의 큰 줄기는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왔고 또한 노력하고 있다. 농사일은 가색(稼穡)농사라 수확하면 주위의 친지들과 조금씩 나누어 먹는 것이요, 글을 쓰는 일은 책 속에서 천고(千古)를 오르내리며 걸어온 것이 올해로써 40번째의 저서가 된다.
필자가 글을 쓰면서 늘 느끼는 것은, 문학은 몹시 춥고 시릴 때 볕을 쪼일 수 있는 양지(陽地)가 되어주고, 폭염 속에 쉴 수 있는 서늘한 나뭇잎 그늘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한 아프고 힘 들 때 한 줄기의 조그마한 바람(願)이 되어주는 빛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나 또한 서툰 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잔잔한 울림으로 다가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고 고민한다.
요즈음 같이 물질의 풍요로움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다시피 하여 물질적 외면적 세계에만 너무나도 집착하고 보니, 정신적 내면적 세계는 그 체질이 점점 더 하약하게 되어버렸다. 미래에 대한 불안, 욕구에 대한 불만,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우리의 정신세계는 점점 더 황폐의 늪으로 빠져들어 자맥질을 하고있는 듯한 느낌이다. 이러한 현실적 정신적 황폐화를 치유하고 인간성의 복원을 위한 손쉬운 노력의 하나가 바로 다름 아닌 시와 수상과 칼람이라는 이름의 문학이 아닌가 싶다. 그러기에 나는 늙어가면서 삶의 여유를 지닐 수 있는 마음의 텃밭에 시를 비롯한 문학이라는 작물을 가꾸며 조용히 살기에 소원해 오고 있다. 세파에 휩쓸리지 않고 청량한 마음으로 얼마 남지 않는 오늘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는 없을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저 누런 벼이삭이 부럽기만 하다.
/김경식 연정교육문화연구소장
기고
정치후원금, 우리 시대의 공인(公人)을 양성하는 제도 청와대는 아닙니다 노후핵발전소가 막고 있는 재생에너지와 송전망 해법 조력발전으로 뛰는 새만금의 심장 일본 사례로 본 방문간호의 미래와 나아갈 길 행안부, 누구를 위한 침묵인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핵심 전략, 데이터 기반 적극적 인재 스카우트 위대한 도시로 가기 위한 선택 APEC 이후 한중관계 전망에 관해 전주권 130만의 희망 대광법 성과 내야 한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