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기명숙 작가, 지연 ‘모든 날씨들아 쉬었다 가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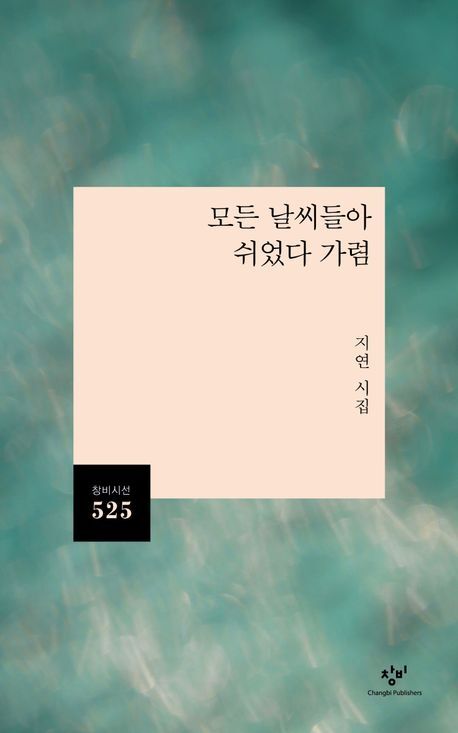
『모든 날씨들아 쉬었다 가렴』 언어 수로를 따라가면 지연 시인이 통과했던 시공간이자 시의 원천인 ‘소룡골’이 나타난다.
흘려보내며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빛을 마신 나비”거나 부석작에서 콩대를 태우며 “몇백 년 전 혈육이 식은 심장을 타닥거리며 나에게 무슨 말을 데우고 있”는 것으로 현존한다.
정합적이지 않은 불가역의 세계라고 의심하지만 시인의 감각이 예민하고 구체적이어서 과거와 현재가 조우하는 ‘환상’을 경험하게 된다. 그 경이와 떨림이 강력하다고 해서 현재를 부정하거나 멈출 필요가 없다.
다만 급박하게 살아가는 나를 돌려세워 시인이 정성을 다해 모셔 온 ‘사라진 것’들을 반추하면 되는 것이다. 익히 그들은 벼랑 끝이든 환대와 도약이든 우리 삶 속에 잠복해 있다 살아있는 존재들을 떠받치고 있었던 것이었으니.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과 죽음으로 존재하는 것은 수평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러한 관습적 사고를 깨뜨리는 지연 시인의 사유(思惟)라고 해도 좋겠고 유한 존재의 열패감을 상쇄, 무한으로 확장하는 것이라 해도 좋겠다.
그것을 가능케 한 지연 시인은 하늘과 땅을 잇는 무(巫) 일종의 샤먼이다. 전라(남)북도 방언과 토속적 시어들을 매개로 시인과 맺어진 인물들 ‘삶의 무늬와 서사’가 입증 근거로 작용한다.
따라서 AI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결코 실패 하지 않고 전진하는 시(詩), 아름답고 따뜻한 곳에 대한 회억(回憶)을 시 독서법과 이질적일듯한 ‘연역적 사고’로 읽어도 좋을 것 같다.
『모든 날씨들아 쉬었다 가렴』 전반은 단순 과거지향이나 추억의 함몰이 아니다. 시인의 고향이자 ‘설화적 무대’인 임실군 청웅면 소룡골 농촌공동체가 빚은 ‘풍습과 생활 감각’은 압권이다.
그곳에서 대지와 인간, 산 자와 죽은 자는 평면의 범주를 벗어나 신화적 환상과 은유를 방편으로 멸실을 거쳐 순환하고 재탄생한다. 시간의 이격에서 오는 상실을 극복하고 지연 시인 아이덴티티에 도달하는 과정은 눈부시다.
누구에게나 ‘내면의 풍경’ 하나쯤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원초적 풍경이 탈각되고 육화된 현재에 이르러서 그 풍경에 대한 그리움과 아련함을 품고 있다면 이 시집으로 달래볼 일이다.
필자 또한 지연 시인 덕분에 잊고 있었던 ‘소박하고 가난했던 풍경’을 떠올려보았다. 삶과 죽음이 이항 대립이 아닌 것처럼 혈육에 대해 이분법적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미움과 원망, 사랑과 그리움이 범벅이 돼 핏속을 떠돌고 있음이 느껴졌다.
웅숭깊은 미덕과 사랑은 복원되었으며 AI 세상을 능가하는 삶의 방식을 일깨운 소룡골, 그곳이 골육상잔의 무대였거나 약육강식 사슬에서 어쩌지 못할지라도 기꺼이 바쳐지고 동화되고 연대하는 방식의 아름다움이라니! 극에 달한 그리움을 내면화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감각으로 발산하는 시적 형상화의 유려함은 덤.
긴장과 밀도 높은 경쟁 속, 고립된 존재로서의 외로움에 휩싸여 살고 있다면 서로 연결되고 섞인, 기꺼이 나를 바칠 수 있는 ‘소룡골’로 가 보시라. 소룡골을 찾는 방법을 모르거나 그 기억으로부터 멀리 떠나왔다면 “돌에 스미는 빗물”을 아주 천천히 바라보면 된다.
사무치게 그리운 존재들이 배격되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육친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지연 시인이 죽은 자와 기대고 얽혔기에 죽음은 단절이나 멸망이 아니라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서로를 움직이게 하는 존재들”임을 강조했던 것처럼.
기명숙 작가는
전남 목포 출신이며, 2006년 전북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시집으로는 <몸 밖의 안부를 묻다>가 있다. 현재 강의와 집필에 몰두하고 있다.
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김근혜 동화작가- 윤일호‘거의 다 왔어! 최기우 극작가-‘완주, 중년 희곡’ 박복영 시인-장선희 ‘조금조금 초록 벽지’ 황보윤 소설가-황석영 ‘할매’ 김영주 작가- 김헌수 ‘내 귓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 날’ 이경옥 동화작가-이라야‘파이트’ 오은숙 소설가-이희단 ‘청나일 쪽으로’ 이진숙 수필가-하기정 ‘건너가는 마음’ 장은영 동화작가-윤일호 ‘거의 다 왔어!’ 이영종 시인 - 황유원 시집 ‘하얀 사슴 연못’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